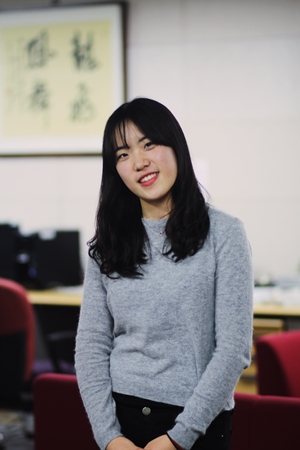
설마 올까 싶었고, 결코 오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왔다. 1년 전 취임의 변을 쓸 때만 해도 ‘밥이 먹히지 않는다’며 위장병을 걱정했는데 이젠 밥을 너무나 잘 먹어 살 찔 걱정을 해야겠다.
지난 3년 대학생활의 모든 것이었던 <전대신문>. 이곳을 계속 했던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다. 신문이 발행되는 월요일이면 두근댔다. 신문을 들고 길을 걷는 독자를 볼 때면 설레었다. ‘신문 더는 못 하겠다’싶다가도 어느새 다음 신문을 만들고 있었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으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듯 독자들에게 한 호, 한 호 더 나은 신문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짝사랑은 끝났다. 나의 짝사랑은 <전대신문>의 기자들이 이어갈 것이다.
임기를 시작할 때 ‘믿어준 만큼 잘 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다짐들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다. 그 판단은 독자와 편집국 기자들에게 맡기겠다.
아, 잊을 뻔 했다. 끊임 없이 반복되는 회의와 취재, 기사 작성에 며칠 씩 집에 가지 못 하면서도, ‘더는 못해먹겠다’면서도 꿋꿋이 버텨주는 기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겠다. 고맙다. 모두 덕분에 행복했다.
이제 어설픈 끝을 내려한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기억에 묻겠다. 독자로서 <전대신문>과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
김성희 전임 편집국장
sd874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