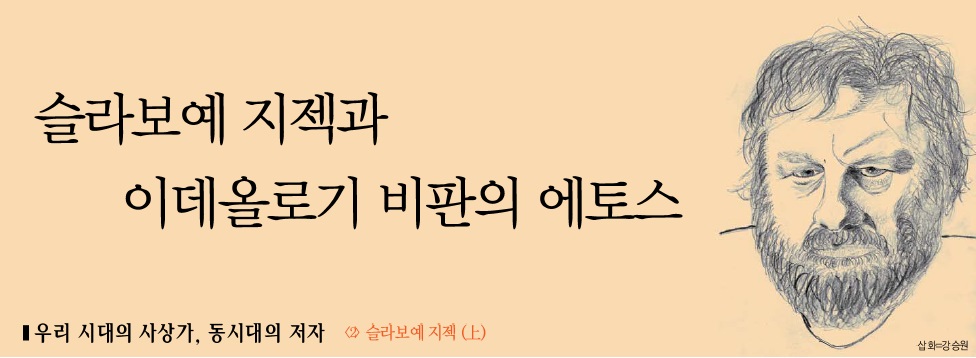
없는 나라에서 온 사상가

지도에 없는 나라 출신의 지식인! 얼핏 낭만적 노랫말 같은 이 표현은 지젝이라는 인물과 그의 사상을 이해하러 가는 길에 적당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 우선 그가 공산주의라는, 더 이상 실체를 지니지 못한—적어도 글로벌한 차원에서 하나의 조직화된 세력으로서는 말이다— 이념을 사유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그가 ‘없는 것의 있음’과 ‘있는 것의 없음’이라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성격을 띤 대상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 (지젝의 유명한 저서 시차적 관점의 원서 뒷표지에는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의 사상을 잘 요약해주는 그 작품의 제목은 ‘슬라보예 지젝은 존재하지 않는다(Slavoj Zizek does not exist)’이다.) (사진1)
없는 것이 있는 척한다는 점에선 한낱 환상(fantasy)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있는 사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실재이기도 한 어떤 대상—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적 대상들 혹은 물신들(fetish)이다. 지젝의 작업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물신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비판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상(理想), 이념 또는 관념을 뜻하는 idea와 학문, 이론 등을 뜻하는 logy의 합성어인 이데올로기(ideology)는 보통 관념론으로 번역되곤 한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념 대립도 (자유민주주의적 대의제 정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로) 끝났다고 말해지지만, 지젝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젝에게 이데올로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 또는 발생적 구조와도 같은 것이다. (지젝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비판을 라캉의 욕망 이론과 큰 타자(‘누빔점’과 ‘주인기표’)에 관한 이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말하는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은 관념론자이고 죽을 때까지 이데올로기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면 관념론은 언어의 본질적 성격이고, 이념성은 정치(사회)의 근본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몸이 있고 숨이 붙어있는 동안 어떤 인간도 순전히 관념론자이거나 순수하게 이념적일 수는 없다. 정치나 이념이나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인간은 위, 아래로 먹고 앞, 뒤로 싸기 바쁜 성적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처조차도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데서—즉, 중도(中道)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얻지 않았는가.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데올로기 비판은 단순히 학문의 한 방법이거나 지성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없는 자기 성찰과 동의어이다. 달리 말해, 이데올로기 비판은 인간이라는 모순적 존재가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해체하는 실천적 방법, 즉 윤리학(ethos)인 것이다.
지젝 사유의 세 성부: 라캉과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
지젝은 통상 라캉(정신분석), 헤겔(철학), 마르크스(사회이론)이라는 세 개의 성부(聲部)를 가지고 자신의 사유를 대위법적으로 구성한다고 알려져 있다(사소하지 않은 세 개의 참조점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니 칸트와 하이데거, 벤야민이 바로 그들이다. 라캉과 하이데거, 헤겔과 칸트, 마르크스와 벤야민). 저들 각각도 어려운데, 셋을 한꺼번에 다루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라캉, 헤겔, 마르크스는 하나의 지성사적 계보에 속하는 이름들이 아니다. 헤겔은 관념론자이고 마르크스는 관념론을 비판한 유물론자였다. 또한 정신분석은 반(反)철학이지 않은가. 그처럼 상이하거나 대립적인 사상들을 하나의 지평에 포개어 어느 정도 일관된 화성(和聲)을 만들어내는 지젝 사유의 대위법적 기교는 어떤 비결을 갖는 것일까? 우리는 그 비법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갱신)이라 불러볼 수 있을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지젝의 갱신과 이데올로기 비판 작업은 (포스트)구조주의를 경유해서 이뤄진다. 이를 엿보기 위해 이데올로기와 언어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어떤 사물과 그것의 이름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무관계의 관계이다. 개(라고 불리는 어떤 동물)가 ‘개’라고 불려야할 이유는 없다(다른 나라에선 ‘도그dog’나 ‘페로perro’라고 불리기도 하지 않는가). 하지만, 적어도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겐, 개가 ‘개’인 것은 유리그릇이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만큼이나 자명하고 필연적인 사태이다. 개가 ‘개’인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은 설명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사태이다. 사물과 언어의 결합이 이뤄지는 영역에는 어떤 이유나 근거도 없지만, 그러한 무근거성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성격을 띤다.
소쉬르가 말했듯이 기표는 자의적(恣意的, arbitrary)이다. 하지만 기표와 기의의 결합, 즉 기호는 그렇지 않다. 기호와 사물,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이뤄지는 곳—말이 성립하는 곳이자 말하는 동물인 인간이 탄생하는 곳—은 근거 자체가 스스로를 형성하는 장(場)인 셈이다. 인간이 사물(존재자들)과 언어(비(非)존재)가 뒤엉켜 이뤄진, 달리 말해 서로 출처가 다른 두 차원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포개어진 것으로서의 ‘세계(Welt)’를 살아간다면—이 점에서 인간은 ‘자연’ 또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는 다르다—, 그러한 ‘세계’에는 필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근거 있음도 아니고 근거 없음도 아닌 어떤 기묘한 (자유의) 지점이 반드시 들어있기 마련이다. ‘세계’의 배꼽과도 같은 이곳이 바로 인간 현존재의 발원지이자 주체의 거주지, 즉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회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순적 분열이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자유’의 자리를 지젝은 라캉의 용어를 빌려서 ‘증상’ 또는 ‘증환(sinthome)’이라고 부른다. 증상은 인간 자신과 인간의 행위들, 인간의 실천적 구성물들—국가와 법에서 예술작품, 심지어 일상적 농담과 실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라캉은 욕망 이론의 유명한 환상 도식(◇a)에서 이를 ‘빗금 그어진 주체(, barred subject)’로 표시하고 있는데 지젝은 이 ‘빗금’(기표에 의한 거세)을 변증법의 ‘모순’ 개념과 등치시키는 것 같다.
여기서 모순은 제거해야할 장애물이 아니라 생산하는 힘이자 근본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간극이다. 마르크스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는 테제에서 계급투쟁은 역사를 발생시키고 지탱하는 갈등의 장소이지만, 그 안에 코뮤니즘이라는 유토피아를 씨앗처럼 품은 곳이기도 하다. 지젝은 바로 그러한 지점을 주체(이자 실체)의 자리로 지키고자 한다. 요컨대 그는 인간 주체를 발생시키는 증상 또는 간극의 비판적 관찰자이자 성실한 수호자이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상처를 낸 창뿐이다.” 지젝이 자주 인용하는 바그너의 <파르지팔>의 이 대사는 다음과 같이 고쳐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라는) 증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을 만들어낸 간극뿐이다.” 여기서 간극(gap)은 인간을 타자적인 것으로 이끄는 욕망의 지향성이다.
없는 곳(utopia) 또는 모순적 간극의 수호자
유토피아를 포함하지 않은 지도는 쳐다볼 가치가 없다고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다. 아마도 지젝은 유토피아(여기와는 다른 곳, 타자의 세계)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지도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 같다. 지젝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모든 인식적 지도, 모든 인간 행위와 역사적 현상들에서 그처럼 숨은 유토피아의 작동, 타자(Autre)의 작용을 들춰내는 일을 수행한다. 유토피아(Utopia)는 어원상 ‘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유토피아는 영원히 없는 곳으로 남더라도, 그러한 타자성에 대한 지향과 실천 속에서 유토피아는 그저 없는 것, 허깨비로 냉소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지젝이 유토피아적 사상가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사회가 정치성을 상실한 채 자연화되고—‘시장 생태계’라는 말을 떠올려보라—, 인간이 타자에 대한 지향성을 잃은 채 동물화 되어가는 오늘날 그의 도발적인 이데올로기 비판 작업의 가치는 지난 20년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