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글은 퇴고(推敲)의 과정을 벌써 수십 번 겪은, 한 마디로 ‘혼’이 담긴 글이라는 것이다. 워워, 오해는 말라.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실 필자는 그리 뛰어난 글쟁이가 아니다. 어떤 소재가 떠올랐을 때 한 번에 쭉, 그것도 몇 분 만에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퇴고를 많이 하는 편이다. 주제를 잡고 초안을 작성하고 글자, 문장 등을 적절하게 고치고 문단 순서를 조정하고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수정을 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자기 전에 또 한 번 읽어보고 수정을 한다. 그 다음날 수업을 듣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머릿속으로 글의 흐름을 생각하며 문장을 재구성한다. 그 이후로도 씻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정말 징그럽게 생각, 또 생각하며 글을 수정한다. 왜 퇴고를 이리도 많이 하느냐고? 이유는 간단하다. 타고난 글쟁이가 아닌 것도 퇴고를 자주 하는 주요한 요인이겠지만 필자가 생각할 때, 퇴고란 성숙의 과정, 글도 다듬고 다듬으면 작가의 혼으로 글에 생명이 부여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너무 공상적인 이야기인가? 하지만 필자는 확실히 믿고 있다. 퇴고를 하는 만큼, 작가의 색, 생각 등이 글에 깃들고 그게 절정에 이르면 단순히 글이 아닌 하나의 혼, 생명으로 볼 수 있다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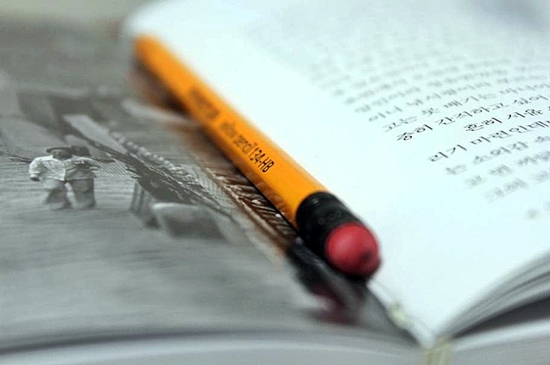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글을 쓰기로 결심한 후부터 여러 서적을 접하고 펜을 잡고 글을 썼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자신이 무척 무능력하게 느껴졌었다. 한 문장 쓰는 데 몇 십 분씩 낭비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싫었는지 모르겠다. 글을 자주 쓰는 사람으로서 어느 글을 쓰고자 할 때, 약간의 소재와 시간만으로도 한 번 만에 원고가 나와야 한다고 믿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은 단어 선정부터 남다를 뿐만 아니라 문장이 무척 유연해서 읽기가 무척 수월하다.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었다. 그래서 무척 연습도 많이 하고 다양한 소재로 여러 글을 써보기도 했다. 하지만 글쓰기는 그 신의 영역을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급함은 더해갔고 그 압박감에 원고들은 틀에 정해진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만 갔다. 점점 글쓰기가 어려워졌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글쓰기를 멀리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사설을 읽다 깨달았다. 퇴고에 관해 어느 유명한 작가가 쓴 사설이었는데, 그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고난을 퇴고의 과정을 통해 극복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잘 쓸 순 없다는 것. 아름다운 글은 한 번에 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눅 들면 안 된다는 것. 많은 작가들이 수많은 퇴고를 통해 길이 기억될 작품들을 내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한동안 서랍 속에 봉인되어 있었던 글들이 다시 광명을 찾게 되었다. 퇴고의 과정을 통해 한때 ‘죽었던’ 글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필자는 퇴고의 과정을 좋아한다. 보잘 것 없었던 글이 깊이 있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 잘 닦여진 감명 주는 글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퇴고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스스로에 대한 용서의 기회랄까.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이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퇴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일 테다.

